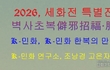K-컬처 장규호 기자 | 별은 밤에 태어나지만, 새벽별은 끝을 알고 있는 빛이다. 김경 작가의 K-그라피 작품 ‘정승호의 새벽별’ 은 이 미묘한 시간의 감각을 화면 전체에 풀어낸다. 깊은 남색과 푸른 층위가 원을 이루며 번져가는 배경은 우주이자 마음의 심연이다. 그 위에 놓인 굵은 붓의 ‘새벽별’은 반짝임이 아니라 의지에 가깝다.

정승호의 시는 묻는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김경은 이 질문을 장식적 별빛이 아닌, 무게 있는 획으로 답한다. 글자는 흘러가지만 무너지지 않고, 번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새벽이 밤을 배반하지 않듯, 희망 또한 고통을 지우지 않는다는 태도다.
작품 곳곳에 흩뿌려진 금빛 점들은 별이자 시간의 파편이다. 그러나 중심은 언제나 하나, 크게 쓰인 제목부에 있다. 중심을 향해 모든 문장이 수렴하고, 다시 바깥으로 호흡한다. K-그라피의 미학은 여기서 분명해진다. 시의 정서가 붓의 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 읽는 행위는 바라보는 행위가 되고, 바라봄은 스스로를 견디는 시간이 된다.
이 작품은 위로를 서두르지 않는다. 새벽별은 밤을 단숨에 밝히지 않는다. 다만 “곧 아침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알려줄 뿐이다. 김경의 작가의 K-그라피는 그 조용한 신호를 시각의 언어로 번역한다.

작가 노트 | 김경 명인
새벽별은
가장 밝은 별이 아니라
가장 오래 남아 있는 별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별을 그리기보다
별이 나타나는 시간을 그리고 싶었다.
붓을 세게 눌렀지만
획을 날카롭게 세우지는 않았다.
희망은 늘 단단하지만
소란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푸른 색을 여러 겹 쌓은 이유는
어둠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사람의 밤도 그렇다.
이 작품을 보는 이가
지금이 밤이라 느낀다 해도
어딘가에 이미 떠 있는
자기만의 새벽별을
잠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